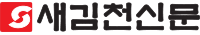홈
특집
기획기사
홈
특집
기획기사
106주년 3·1절 특집- 김천의 독립운동가 박내영(朴來英) 박태안(朴泰安)
증산면 유성리 출신 독립운동가 박내영
경주 대구에서 독립운동,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황금동 출신 독립운동가 박태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대통령 표창 추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소국이거나 나라를 잃었을 때의 설움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서럽고 억울하기 그지없다. 1910년 일제에 강제로 병합돼 국권을 찬탈당하고 36년간이나 식민압제에 시달린 우리나라와 민족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멸실 당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이에 선각자들이 그 설움을 떨쳐내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권회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우리고장 김천에서도 수많은 독립유공자가 배출됐다. 3.1절 106주년을 맞이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분의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아 그 장한 뜻과 충절을 선양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편집자주>
박내영(朴來英)은 일제강점기 김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1873년 2월 25일 지금의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351번지에서 태어났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박영조(朴永祚)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18년 경주읍에 있는 도동리교회(현 경주제일교회) 목사로 부임해 목회 활동을 했다. 19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산 사월교회 목사 김기원이 박내원을 찾아와 대구 지역의 만세 시위 상황을 전하면서 경주 지역도 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박내영은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교회 신자 박문홍, 김학봉, 윤기호 등과 3월 13일 경주읍 장날에 만세 시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3월 12일 밤 박내영은 박문홍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 당일 새벽 동지에게 배포하던 중 미리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에 발각돼 박문홍 등 15명과 함께 체포, 구금됐다. 이로 인해 경주읍 장날의 시위는 무산됐으나 체포되지 않았던 김학봉과 최성렬 등 청년들과 박내영의 체포에 반발하던 교인들을 중심으로 3월 15일 경주읍의 장날을 기해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
이후 박내영은 박문홍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박내영은 대구 남산교회 목사로 목회 활동을 했다. 아울러 대구기독교청년회의 종교부장으로 활동하다 1923년 대구 남성정교회 이만집 목사를 중심으로 자치교회가 설립되자 이에 동참했다. 자치교회 선언은 당시 선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대구 계성학교 운영에 대한 반발로 표출된 것이었다.
자치 교회 선언을 주도한 이만집은 남성정교회 목사로서 대구기독교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이만집의 행동에 박영조도 동참했던 것이다. 이른바 자치 교회 선언에 대해 선교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북노회는 1923년 3월 노회에서 이만집과 박내영을 정직 처분했다. 정직 처분 이후의 복권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내영은 경상도 지역의 개신교 조직인 경상노회에서 경북노회가 분립될 때 초대 경북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경북노회 내의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1936년 11월 경주, 영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동노회가 분립됐고 박내영은 초대 경동노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경상북도 흥해읍교회, 고령군 고령읍교회, 안림교회, 경산읍 하양교회의 목사로 시무했으며 은퇴 후엔 순회 목사로 개신교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60년 별세하자 같은 해 6월,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으며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박태안(朴泰安)은 1898년 6월 14일 김천시 황금동에서 태어났으며 박태언(朴泰彦)으로도 불렸다.
평양, 서울 등지에서 3·1운동을 목격한 김천면 황금정교회(黃金町敎會) 소사(小舍) 김충한(金忠漢)과 대구에서 3·8 만세운동에 참여한 계성학교(현 계성고등학교) 학생 김수길(金秀吉)은 황금정교회 장로 최용수(崔龍洙), 같은 교회 직원 한명수(韓明洙)와 함께 김천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이에 박태안도 3월 9일 밤 남산동 최용수의 집에서 주남태(周南泰), 김원배(金元培), 차경곤(車敬坤), 김성집(金聖執) 등과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협의했다.
김충한, 김수길은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을 기초하기로 하고 최용수, 김수길, 박태안은 인쇄를 담당했다. 최용수는 인쇄를 위해 방 하나를 제공하고 김수길, 박태안은 그 등사와 배포를 담당하기로 했다.
또 김수길은 베로 된 태극기를, 주남태, 김원배는 종이로 된 태극기를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3월 11일 오후 3시 감호동 부근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거사의 순서는 먼저 조선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한 후 그곳에서 군중들에게 경고문을 나눠주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김천 시내를 행진하기로 했다.
시위 주동자들은 실행 방법을 결정한 후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서둘렀다. 3월 10일 김충한은 김수길이 교회당에서 빌려 온 등사판을 이용해 경고문 약 300매를 복사했다. 또 주남태, 김원배는 종이 태극기 50장을 만들어 3월 10일 오전 9시 황금동 한상태(韓相泰)의 집으로 가서 김천공립보통학교 학생 한정리(韓定履), 석동준(石東俊), 박희철(朴喜徹) 등을 만나 다음날 일으킬 의거를 설명한 후 학우들과 같이 많이 참석하도록 권유하면서 태극기를 나눠주었다.
한명수는 교동 예수교회당에서, 김재위(金在緯)는 같은 예수교회당의 허학선(許學善) 외 두 명에게 다음날 의거에 참가하도록 일러두었다.
3월 11일 아침 석동준은 받은 태극기 가운데 16장을 들고 김천공립보통학교로 가서 학생 김종호(金鐘昊) 등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이를 나눠주면서 오후 3시에 태극기를 들고 거사에 참가하도록 일러두었다.
그러나 거사 직전인 3월 11일 오전 11시 일본 경찰에 시위 준비가 발각됨에 따라 만세 시위는 실패로 끝났으며 이때 박태안도 체포됐다. 당시 재판에 회부된 주동 인물로는 박태안을 비롯해 김충한, 최용수, 주남태, 김원배, 한명수, 석동준, 김재위, 차경곤, 김성집이 있었다.
1919년 5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형을 선고받은 박태안은 10월 16일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충한은 징역 2년, 최용수는 징역 1년 6개월, 주남태, 김원배, 한명수, 차경곤은 징역 10개월, 김재위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투옥됐다.
박태안은 1972년 별세하였으나 훗날 그 공로가 인정돼 2006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자료제공: 김천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