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한반도 남부 내륙의 군사, 교통의 요충지 김천
삼한시대부터 전란시마다 치열한 전투 벌어져
군관민 함께 축성한 산성,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산성이라 함은 산(山)에 쌓은 성(城)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대포와 미사일, 항공기와 같은 근현대적인 무기체계가 발달한 지금의 전쟁에서는 그 용도가 무의미하지만 활이나 칼, 창을 보병의 주요 무기로 사용하던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는 흙이나 돌로 높게 쌓아올려 군사의 접근을 차단하던 성곽이 주요한 군사시설이었다.
김천지역은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앙에 위치해 삼한시대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나라에 둘러싸인 입지적인 여건상 군사, 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간주돼 전란 시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적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의 피난처로서 삼한시대로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산성은 삼국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 보수가 이어져 그 윤곽이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문헌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산성은 감문산성, 고소산성, 속문산성, 덕대산성, 고성산성 등인데 여기에서는 그 윤곽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는 감문국시대 축성된 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천지역 최초의 산성인 감문산성(甘文山城)
감천유역 일대에 드넓게 펼쳐진 평야지대가 감문국의 경제적 기반이었다면 해발 239미터의 감문산은 그 배후에 해당하는 진산으로 유사시 피난처 및 지휘소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문산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인위적으로 축조된 흔적이 뚜렷한 토성(土城)이 길이 200미터, 높이 2.5미터, 성폭 10미터 남짓 남아있는데 특히 중앙부의 흙을 파내어 정상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급경사가 되도록 쌓고 중심부를 평평하게 조성했다.
감문산은 달리 성황산(城隍山)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감문산이 감문국의 내성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堡壘)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취적봉(吹笛峰) 또는 봉수산(烽燧山)으로도 불리는 바 이는 국가에 변란이 있을 때 산정상에서 피리를 불거나 봉화불을 피웠다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전하는데 봉수대의 흔적은 지금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상주 사벌국과의 경계에 자리한 속문산성(俗門山城)
감문면 문무리와 송북리 사이의 속문산(俗門山) 해발 600미터지점에 산정 능선을 따라 동북으로 석성(石城)과 토성(土城)이 혼용돼 축조됐고 성북마을이 있는 동북쪽으로는 자연절벽을 그대로 활용했다.
확인된 성곽은 석축을 70cm정도 하단에 먼저 쌓고 그 위에 토성을 쌓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높이는 250cm, 길이 800미터에 달하는데 석성은 대부분 무너지고 현재 일부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성내 북서쪽 끝부분에는 둘레 30미터, 지름 10미터, 높이 5미터의 봉수대터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무연고 묘지가 정상부에 들어서 있다.
군창지(軍倉址)로 추정되는 정상부 하단 평탄지에서는 지금도 무수한 와편(瓦片)이 산재해있고 건물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는 대형 주춧돌이 남아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속문산성에 관해 “石築周圍二千四百五十五尺 高七尺 內有二泉二池 有軍倉” 즉 “석축의 둘레는2455척이고 높이는 7척인데 성내에 우물 2개와 못 2개, 군창이 있다”고 적고 있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도 속문산성과 관련된 구절이 등장하는데 “在郡北四十里石築周二千四百五十尺內有二千二池” 즉 “군의 북쪽 40리에 있는데 석축의 둘레가 2540자이고 안에는 두 개의 샘과 두 개의 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우물과 저수지의 존재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해본바 30여년 전까지 우물과 물이 고인 큰 규모의 웅덩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속문산은 다른 이름으로 백운산(白雲山)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에 이르길 감문국이 신라에 망하게 되자 백성들이 속문산으로 들어가 끝까지 항전하다가 급기야 몰살을 당했고 그 원혼이 구름으로 변해 산을 덮으니 이후 백운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완벽한 형태가 보존된 고소산성(姑蘇山城)
감문면 문무리와 어모면 구례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365미터의 고소산(姑蘇山), 일명 성산(城山) 정상부로부터 50여미터 아래에는 남북으로 길이 700미터에 달하는 허물어진 석성이 남아있는데 멀리 속문산성과 마주보는 형국을 하고 있다.
석성의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나 일부는 높이 5미터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성벽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골짜기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정밀하게 축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성인 감문산성, 토성과 석성이 혼재된 속문산성과 달리 고소산성은 거의 대부분을 석재로 축성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옹성(甕城)이 있었을 가능성 등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이전의 축조방식과 달리 가공한 석재를 이용해 한층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축성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문국의 주무대였던 개령면과 감문면 일대의 해발300미터 내외의 산정에는 크고작은 산성들이 축조되었는데 이것은 신라가 감문국이 입지한 김천지방을 가야공략의 전진기지로 삼는 동시에 추풍령 확보를 통한 금강유역진출에 사활을 걸고 감문국을 집중 공략하는 과정에서 감문국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산성을 축조했던 것으로 보이며 감문국 복속후에도 신라는 이 지방에 감문군(231년), 감문주(557년)를 설치하는등 지방행정과 군사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감문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의 개보수를 통해 가야와 백제의 공략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문국시대의 산성으로 추정되는 이들 세 성의 축조시기는순수토성인 감문산성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그 뒤로 토성과 석성이 혼재된 속문산성, 석성이 주를 이루며 규모와 그 정교함에서 돋보이는 고소산성이 가장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산성유적의 복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고대국가의 기틀이 확립되기 이전에 성립되었던 감문국을 비롯한 무수한 소국의 존재는 승자인 신라의 역사에 묻혀 그 유적과 기록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을 근거로 존립했던 감문국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흔적을 찿는 노력을 부단히 진행해야함은 선사시대로부터 고대국가의 기틀이 확립된 삼국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사적 징금다리이기 때문이며 지역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선결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과 개발의 과정을 통해 우리 고장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산성 유적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산성 유적 복원을 통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송기동(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저작권자 새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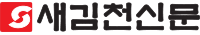



 홈
홈













